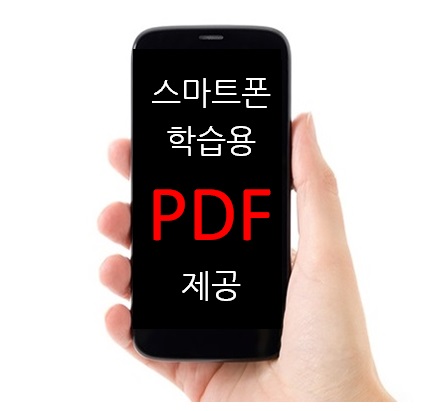버마(현재의 미얀마)의 수도 랭군(현재의 양곤)의 아웅산묘소에서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공작원에 의해 저질러진 폭파사건. 1983년 10월 9일에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대통령 공식 수행원과 수행 보도진 1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미얀마인 3명도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하기 전이어서 위기를 모면했다. 희생된 17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서석준(徐錫俊), 외무부장관 이범석(李範錫), 상공부장관 김동휘(金東輝), 동자부장관 서상철(徐相喆), 대통령 비서실장 함병춘(咸秉春), 민주정의당 총재 비서실장 심상우(沈相宇),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재익(金在益), 재무부차관 이기욱(李基旭), 주 버마대사 이계..